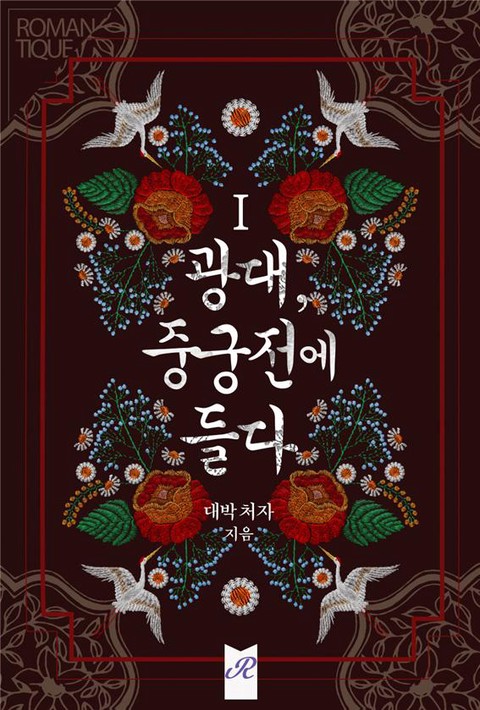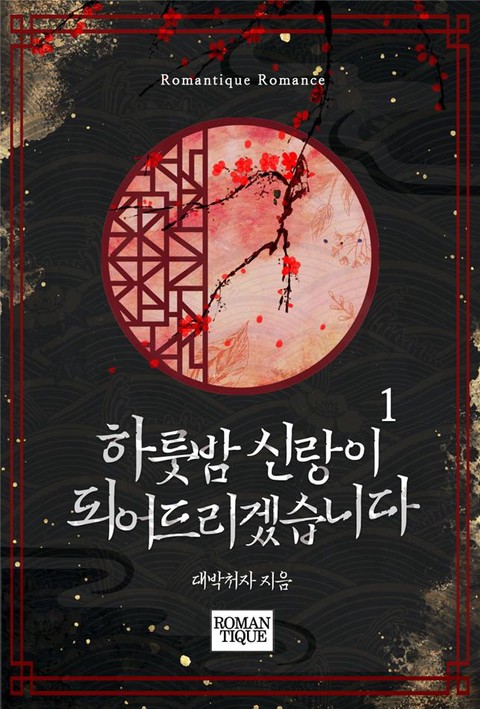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도은은 열 한 살 때 홀로 외가에 찾았다가 마을 유지 아들에게 잘못 걸려 된통 당하게 되고
그런 그를 열 여섯살인 순영이 구해주었다.
실수로 입맞춤이 이어지고 도은은 둘째 형수 말처럼 제 가슴이 마구 뜀에 점점 순영을 마음에 품게 되고...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도은은 순영에게 혼인을 하자 하며 정표로 물망초 댕기를 빼앗듯 가지고 갔다.
일년 뒤, 꼭 올 것이라 약조를 하며....
허나 일년이 지나도 도은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칠 년이 지나고 아버지 김수광이 임금의 부름으로 한양에 오게 됨에 스물 세살이 된 순영도 한양으로 오게 되는데...
열 여덟이 된 도은과 스물 셋이 된 순영, 두 사람의 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본문 중에서-
‘맴맴…….’
한층 더 커진 매미 소리가 정적을 깨웠다. 순영은 동수가 떠난 지 오랫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왠지 그래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한참이나 힘을 주고 있어서 그런지 팔 다리가 저려 왔다. 고개를 들어 자신의 머리에 아직 붙어 있을 굼벵이를 떼어 내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짧게 심호흡을 한 다음 자신의 가슴팍에 안겨 있는 어린 도령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정신이 돌아 오지 않은 듯했다. 순영은 도령을 바닥에 눕히기 위에 조심히 머리를 받치고 앞으로 숙였다.
그때였다. 경직된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꼬꾸라졌다. 순간 눈을 찔끔 감았다.
‘털썩’
딱딱한 바닥이 아니었다, 연한 피부가 그녀의 입술을 간지럽혔다. 놀란 순영은 눈을 떠 버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앞으로 흘러내린 자신의 진 다홍빛 댕기가 도령의 눈을 가려 주고 있었다. 순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망측한 상황에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녀는 얼른 자기 입술을 도령의 입술에서 떼어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려 팔에 힘을 주었다.
한데 이게 웬일, 팔꿈치가 꼿꼿이 서지 못하고 꺾여 버렸다. 그로 인해 몸이 다시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다. 좀 전보다 더 밀착된 몸과 입술에 순영은 얼굴이 붉어질 대로 붉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녀의 맘을 더 혼란스럽게 한 건 갑자기 순영의 입안에 불어 닥친 따뜻한 도령의 숨결이었다.
‘깨어난 건가?’
순영은 팔에 다시 힘을 주고 최대한 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도령의 얼굴을 살폈다. 눈이 감겨져 있었다.
‘꿀꺽……’
마른 입안을 침으로 적시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후유…….”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느새 한낮의 더위가 물러가고 숲속으로 들어오던 햇살도 줄기를 거두고 서늘한 바람을 자기 대신 내려 보냈다.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수건을 입술로 가져다 대었다 떼었다. 반대편 손가락으로 입술을 다시 훑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신을 잃은 도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순영은 눈을 찡그리며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진 손수건 귀퉁이에 피가 묻어 있었다.
아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은 없다. 단지 도와주려 한 것뿐이었고 아까 그건……그래 사고였다. 명백한 사고. 부끄러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순영은 도령에게 다가갔다. 하얀 얼굴 위로 나뭇잎 그림자가 넘실거렸다. 피가 뺨이랑 입 주변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순영은 자연스레 손수건을 도령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새빨간 피가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더 창백하게 보였다. 그녀의 손의 움직임이 느려지더니 어느 순간 멈춰지고 손길을 거두어 들었다. 그 대신 그녀의 눈길이 도령의 얼굴로 향했다. 순영은 조금 물러나 꽃을 관찰할 때 취하는 모양으로 유심히 도령을 살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처음 보았을 때부터 눈에 들어온 하얀 피부. 좀 전의 아이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순영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 보고 입을 삐죽였다. 저 도령이 비정상이지 난 정상이라고! 하는 표정으로 다시 도령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까만 눈썹과 시원하게 뻗은 콧날이 전체적으로 가는 얼굴을 여인네가 아닌 남자 얼굴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마냥 평안히 감겨져 있는 눈. 감겨져서 눈빛이 어떠한지 모르나 무척 궁금하다. 긴 속눈썹이 더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입술. 순영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연분홍빛이 감도는 일자로 다문 입술은 피와 어울려 더 진하게 윤기가 흘렸다.
정말 잘난 얼굴이다. 남정네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 분명 이런 인물이 흔치 않을 것이다. 한양이면 몰라도…….
‘한양……’
삼년 전 떠나온 한양이 멀게만 느껴졌다. 이제 돌아가지 않을 곳이다.
순영은 바람에 살짝살짝 움직이는 도령의 하늘 빛 전복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잘 어울렸다. 그때 나뭇잎 하나가 날아와 도령의 가슴팍에 내려앉았다. 순영은 무심결에 나뭇잎에 손을 가져가다 멈추었다. 만져 보고 싶었다. 도령의 얼굴을…….
그런 그를 열 여섯살인 순영이 구해주었다.
실수로 입맞춤이 이어지고 도은은 둘째 형수 말처럼 제 가슴이 마구 뜀에 점점 순영을 마음에 품게 되고...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도은은 순영에게 혼인을 하자 하며 정표로 물망초 댕기를 빼앗듯 가지고 갔다.
일년 뒤, 꼭 올 것이라 약조를 하며....
허나 일년이 지나도 도은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칠 년이 지나고 아버지 김수광이 임금의 부름으로 한양에 오게 됨에 스물 세살이 된 순영도 한양으로 오게 되는데...
열 여덟이 된 도은과 스물 셋이 된 순영, 두 사람의 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본문 중에서-
‘맴맴…….’
한층 더 커진 매미 소리가 정적을 깨웠다. 순영은 동수가 떠난 지 오랫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왠지 그래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한참이나 힘을 주고 있어서 그런지 팔 다리가 저려 왔다. 고개를 들어 자신의 머리에 아직 붙어 있을 굼벵이를 떼어 내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짧게 심호흡을 한 다음 자신의 가슴팍에 안겨 있는 어린 도령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정신이 돌아 오지 않은 듯했다. 순영은 도령을 바닥에 눕히기 위에 조심히 머리를 받치고 앞으로 숙였다.
그때였다. 경직된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꼬꾸라졌다. 순간 눈을 찔끔 감았다.
‘털썩’
딱딱한 바닥이 아니었다, 연한 피부가 그녀의 입술을 간지럽혔다. 놀란 순영은 눈을 떠 버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앞으로 흘러내린 자신의 진 다홍빛 댕기가 도령의 눈을 가려 주고 있었다. 순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망측한 상황에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녀는 얼른 자기 입술을 도령의 입술에서 떼어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려 팔에 힘을 주었다.
한데 이게 웬일, 팔꿈치가 꼿꼿이 서지 못하고 꺾여 버렸다. 그로 인해 몸이 다시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다. 좀 전보다 더 밀착된 몸과 입술에 순영은 얼굴이 붉어질 대로 붉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녀의 맘을 더 혼란스럽게 한 건 갑자기 순영의 입안에 불어 닥친 따뜻한 도령의 숨결이었다.
‘깨어난 건가?’
순영은 팔에 다시 힘을 주고 최대한 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도령의 얼굴을 살폈다. 눈이 감겨져 있었다.
‘꿀꺽……’
마른 입안을 침으로 적시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후유…….”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느새 한낮의 더위가 물러가고 숲속으로 들어오던 햇살도 줄기를 거두고 서늘한 바람을 자기 대신 내려 보냈다.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수건을 입술로 가져다 대었다 떼었다. 반대편 손가락으로 입술을 다시 훑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신을 잃은 도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순영은 눈을 찡그리며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진 손수건 귀퉁이에 피가 묻어 있었다.
아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은 없다. 단지 도와주려 한 것뿐이었고 아까 그건……그래 사고였다. 명백한 사고. 부끄러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순영은 도령에게 다가갔다. 하얀 얼굴 위로 나뭇잎 그림자가 넘실거렸다. 피가 뺨이랑 입 주변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순영은 자연스레 손수건을 도령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새빨간 피가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더 창백하게 보였다. 그녀의 손의 움직임이 느려지더니 어느 순간 멈춰지고 손길을 거두어 들었다. 그 대신 그녀의 눈길이 도령의 얼굴로 향했다. 순영은 조금 물러나 꽃을 관찰할 때 취하는 모양으로 유심히 도령을 살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처음 보았을 때부터 눈에 들어온 하얀 피부. 좀 전의 아이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순영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 보고 입을 삐죽였다. 저 도령이 비정상이지 난 정상이라고! 하는 표정으로 다시 도령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까만 눈썹과 시원하게 뻗은 콧날이 전체적으로 가는 얼굴을 여인네가 아닌 남자 얼굴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마냥 평안히 감겨져 있는 눈. 감겨져서 눈빛이 어떠한지 모르나 무척 궁금하다. 긴 속눈썹이 더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입술. 순영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연분홍빛이 감도는 일자로 다문 입술은 피와 어울려 더 진하게 윤기가 흘렸다.
정말 잘난 얼굴이다. 남정네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 분명 이런 인물이 흔치 않을 것이다. 한양이면 몰라도…….
‘한양……’
삼년 전 떠나온 한양이 멀게만 느껴졌다. 이제 돌아가지 않을 곳이다.
순영은 바람에 살짝살짝 움직이는 도령의 하늘 빛 전복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잘 어울렸다. 그때 나뭇잎 하나가 날아와 도령의 가슴팍에 내려앉았다. 순영은 무심결에 나뭇잎에 손을 가져가다 멈추었다. 만져 보고 싶었다. 도령의 얼굴을…….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소장
권당 3,600원
전권 7,200원
시리즈
로맨스 단행본 랭킹
더보기-
1.
농교유복 [단행본] -
2.
슈가 앤 스파이스 [단행본] -
3.
한문적녀유공간 [단행본] -
4.
짝사랑 맞선 [단행본] -
5.
재성원령기 [단행본] -
6.
청규령 [단행본] -
7.
국색방화 [단행본] -
8.
배덕한 관계[개정판][삽화본][단행본] -
9.
계약해요, 나랑 [단행본]
개인정보보호 활동
2024-E-R047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
![연(緣)을 잇다 (외전추가) [단행본]](https://img.mrblue.com/prod_img/ebook/c6741/cover_w480.jpg)